동포들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려인 1~3세, 연금생활 ‘극빈층’ 허덕
작성자최고관리자작성일2007-01-28 00:00:00조회681회
“한국인 퇴폐관광문화 부끄럽다”
현지 대사·대학교수등 토로
[강제이주 70년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중앙아시아의 한류가 드라마로 시작됐다면, 새롭게 감지되는 ‘혐한류’의 징조는 단연코 퇴폐 관광문화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런 두 가지 흐름은 사실상 현지인화하고 있는 고려인 4~5세대들에게 빛과 그림자가 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최고 명문 동방대학의 윤태영 교수(한국어학과)는 “경제가 앞서고, 드라마를 통해 한국이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우즈베크 안에서 위상이 높다고 얘기하는 건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위상은 경제력보다 다른 민족의 문화를 배려하고 품을 줄 아는 도량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룸살롱 등의 밤 문화, 관광문화에 대해 “현지 고려인이나 우즈베크 사람들은 비싸서 가지도 못하는 특수 문화를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며 “부끄럽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선교활동에 나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나 기독교계 단체들의 활동도 새로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고려인돕기운동본부의 이현경 자원개발팀장은 “한국의 큰 교회에서 시민단체로 위장파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선교활동이 금지된 우즈베크에서 암암리에 무리한 선교활동을 펼치다가 쫓겨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타슈켄트 외곽의 낙후한 농촌지역에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이종수 국제기아대책기구 실장은 “한국에서 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비자 연장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두 쫓겨날 만큼) 절박한 위기”라고 말했다.
문하영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는 “우즈베크는 그냥 좀 못사는 나라일 뿐, 한국이 무시할 수 있는 민족은 아니다”라며 “특히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 구호품을 적선하듯 지원하려는 것이나 종교 한탕주의로 보일 만큼의 무리한 선교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한국인’들이 고려인에게도 시혜적 접근이 아닌,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9월23일
고려인 1~3세, 연금생활 ‘극빈층’ 허덕
집단농장 쇠락따라 힘겹게 일군 터전 잃어 “타슈켄트 주변에만 무의탁 노인 100여명” 대사관 “마지막 편한 삶 도울 지원책 절실”

» 러시아 남부 볼가강 지역의 사라토프에서 전알렉산더(64·고려인 3세)씨가 손녀를 안고 망향의 마음을 달래고 있다. 원래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전씨는 농사지을 땅을 갖지 못해 이곳에 소작농으로 왔다. 윤덕호(다큐멘터리 감독)씨 제공
타슈켄트 중심부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프라우다’는 과거 융성했던 콜호스(집단농장)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2006년 프라우다에는 대륙을 휘젓는 ‘한류’도 가닿지 않는 곳이다. 생존하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 있을 뿐이다. 이곳엔 무의탁 노인 9명이 살고 있다. 가난한 나라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극빈층에 속한다. 모두 고려인 1~3세대다.
“여기가 갈대밭이었어요. 1937년 여기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이 다 개간해서 ‘살아 있는 땅’으로 만들었죠. 그 일을 하면서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해요.” 지난 6일 프라우다에서 만난 자원활동가 정덕영(고려인돕기운동본부)씨의 설명이다.
갈대밭이 변한 우즈베키스탄의 농촌은 1937년 이후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눈물’ 속에 새 삶을 일궜던 알짬 터전이었다. ‘땅심’으로 가정을 일으켰고 후대를 가르쳤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래, 집단농장이 퇴락하면서 이농현상이 극에 이르고, 남아 있던 이들조차 대개 우즈베크인에게 밀려 땅 없는 소작농 신세가 됐다.
프라우다의 고려인들은, 1~3세대와 미처 떠나지 못해 도태한 일부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자식들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주는 한달 평균 4만~5만원의 연금에 기대어 겨우 연명하고 있다. 한달 2만4천원의 연금으로 쉰셋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황마트료나(87·여), 생활력 없는 아들과 4만원의 연금으로 삶을 버텨내고 있는 유엘레나(80·여)씨는 그 자체로 또하나의 비극적 민족사다.
우즈베크 한국대사관의 강경랑 영사는 “현재 타슈켄트 인근에만 독거노인을 포함한 100여명의 극빈층 고려인이 살고 있다”며 “이들을 돌보지 않고서는 고려인 사회의 미래도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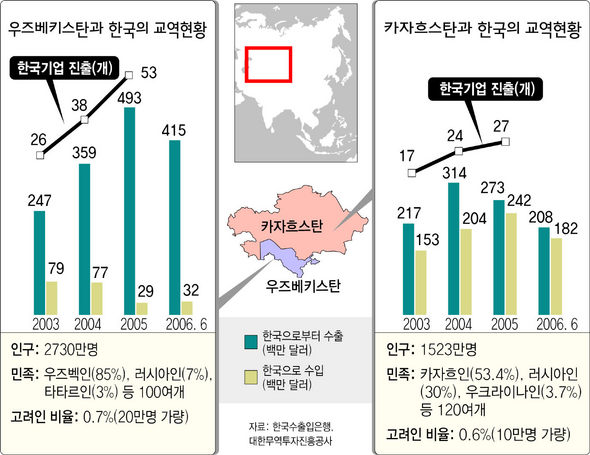
현재 대사관은 내년 강제이주 70돌을 맞아 양로원 건설 사업 등 정부 차원의 극빈층 지원 복안을 마련하고 있다. 강 영사는 “나이 많은 고려인 동포를 위로하고 ‘마지막 편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사관은 물론 우즈베크 내 고려인 최대 모임인 고려인문화센터조차도 연령대별 고려인 수나 직업 실태, 생활수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엔 프라우다 마을에서 모처럼 웃음소리가 퍼졌다. 한국의 청년회의소(JCI) 경기지부가 고려인 노인들을 중심으로 우즈베크 마을 주민까지 함께 초청해 경로잔치를 벌인 덕분이다. 모두 100여명이 모인 이날, 박알렌(61)씨는 “독립기념일(9.1)이나 명절 때나 겨우 즐겨볼 수 있는 잔치였다”며 흐뭇해했다. 고려인만 500가정 가량이 살고 있는 프라우다 들녘 너머로도 추석은 찾아오고 있었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홈으로
홈으로




